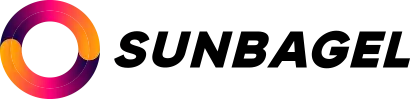교수 K (이하 K): 에디터 님, 혹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에디터 G (이하 G): 네, 교수님! 예전에 경제 수업에서 들어봤어요. 신문, 기사 등 다양한 곳에서도 활용되고요.
K: 그렇죠.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보이지 않는 손’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대표작인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에 처음 등장한 용어예요.
그는 각 개인이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는 행동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린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 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는데요. 오늘은 정말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이지 않는 손의 핵심 도구는 바로 ‘가격’
K: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하나 필요한데요. 무엇일까요?
G: 음… 시장이 자율적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얼마인지 정해져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K: 잘 파악하셨어요. 바로 ‘가격’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비싼 가격도 영원할까” 아티클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됩니다.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신호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소비자들은 가격이 낮아지면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지만,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반면 생산자들은 가격이 높아지면 더 많은 이윤을 기대하며 생산을 늘리고, 가격이 낮아지면 생산을 줄입니다.
G: 서로 반대로 움직이네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일 행사에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K: 그렇죠. 이와 같은 가격 메커니즘은 시장에서 초과 공급이나 초과 수요를 완화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시장 가격이 균형 지점으로 수렴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가격 메커니즘에 따르면, 희소한 자원일수록 가격이 올라가고 흔한 자원은 가격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되는데요.
팬데믹 초기를 떠올려볼까요? 초기에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인해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적이 있었어요. 이러한 가격 상승은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생산량을 늘리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했고, 마스크 생산과 공급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가격은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었죠.
G: 똑똑히 기억나요. 흔한 소비재였던 마스크가 구하기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가격이 몇 배는 뛰었어서 정말 혼란스러웠거든요.
K: 그쵸, 많은 분들이 처음 겪는 현상이라 놀라셨을 거예요. 이렇게 외부의 별다른 개입 없이 시장 스스로 가격을 조정하고, 이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실패와 정부의 개입
G: 교수님, 그럼 보이지 않는 손은 늘 시장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나요?
K: 좋은 질문이에요. 항상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면서 유독 물질을 공기 중으로 몰래 배출했다고 가정해보죠. 이때 공장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오염 물질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이 상황을 그냥 시장에 맡겨둘 경우, 오염 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적인 피해에 대해 공장은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을 거예요.
이처럼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황을 외부효과(externality)라고 부르는데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부정적인 외부효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장 실패(market failure)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G: 아무래도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제동을 걸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겠네요.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K: 시장 실패의 또 다른 예시로 시장지배력(market power)으로 인한 가격의 자동 조절 기능 상실을 들 수 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Standard Oil) 회사의 실제 사례를 살펴볼게요.
스탠더드 오일은 1870년에 존 D. 록펠러(John D. Rockefeller)가 설립한 회사인데요. 19세기 말에 스탠더드 오일은 미국 석유 시장의 약 90%를 장악하며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쟁사들의 계약을 방해하거나, 가격 덤핑 전략을 사용하여 소규모 석유 회사들을 하나씩 퇴출시켜 버렸고요.
이렇게 시장을 지배하며 더 이상 경쟁을 할 필요가 없게 되자, 스탠더드 오일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연료비를 부담해야 했죠.
이와 같이 시장이 소수의 기업에 의해 지배되면 가격은 더 이상 자유롭게 조정되지 않고, 자원의 배분도 왜곡됩니다.
G: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재화에 대해 서로 다른 가격을 가진 여러 개의 제품이 있어야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아무 비교도 없이 하나의 기업이 제공하는 재화만 하나의 가격에 구입해야 하니… 시장 독점이 위험한 이유겠네요.
K: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자는 반드시 사회에 환원해야 할까?” 아티클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방 서비스와 같은 공공재는 누군가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동일한 재화를 소비하는 데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공공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낮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두면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외부효과, 시장지배력, 공공재의 공급 제한 등과 같은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돼요. 결국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G: 정부가 개입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K: 대표적으로 ‘세금’이 있겠죠. 정부는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오염 물질을 상대적으로 덜 배출하는 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을 통해 외부효과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여 시장에서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스탠더드 오일의 경우 ‘셔먼법(Sherman Act)’이라 불리는 반독점법에 따라 34개의 기업으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리게 됩니다.
최근 구글이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독점적인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대한 기업 분할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